
무교에 사용되는 신기물(神器物) 가운데 무당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방울이다. 방울은 곧 무당의 상징물이다.
방울을 사용하는 목적은 소리를 내는 데 있다. 보통 방울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쇠가 방울 안에 달려서 소리를 낸다. 그러나 무당들이 사용하는 방울은 방울이 서로 부딪치면서 소리를 내 일반 방울과 다르다.
방울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금황자(金晃子), 영금당(鈴金當), 탁령(鐸鈴), 영(鈴)이라 부르며 소리 나는 물체를 의미한다.
무당들이 사용하는 기물(器物) 중에 소리 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종(鍾)이다.
방울과 종의 공통점은 맑은 금속음으로 신령을 불러들이고, 신령과 교신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종은 신당 천장에 매달아 놓고 아침저녁, 또는 단골을 축원할 때 신을 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경쇠라는 아주 작은 종이 있다. 칠성거리 굿에서 명복을 기원할 때 사용하는 무구이다.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악기 중 빠져서 안 되는 것이 장구와 징이다. 여기서도 징은 땅의 소리로, 장구는 하늘의 소리라고 한다.
장구와 북을 치면서 천지의 소리 즉, 우주 최초의 소리인 율려(律呂)로 천지조화를 음악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주의 소리를 재현하기 위하여 최초로 만든 악기가 편경이다. 천자가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은 특경이라고 한다.
북과 징은 최초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 소리, 즉 율려를 인간들이 재현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의 소리에 맞춰서 무당들이 춤을 추면 굿을 하는 것이다.
방울은 내림굿할 때 무녀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숨기는 신기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방울의 소리를 듣고 어디에 숨겼는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울은 모든 굿거리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신을 청하는 의미로 쇠내림 할 때와 만수받이가 끝나고 부채를 장구 위에 늘어뜨리고 그 위에 방울을 흔들기도 하고, 신의 말이라는 공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또 굿을 하는 중간에 전물상에 바쳐진 음식에 방울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신들이 음식을 드시는 의미를 나타낸다. 황해도 군웅거리에서 간혹 무당들이 귀신들에게 씌어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방울을 흔들기도 한다. 조상거리에서는 죽은 조상들의 저승길을 인도하는 의미로 방울을 흔들기도 한다.
대신방울 끝부분에 흰색, 붉은색, 노란색, 군청색의 천을 매달기도 한다. 이러한 풍습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짐작할 수가 없으나, 아마 상고시대에 모우(旄牛)의 꼬리를 잡고 하늘에 제를 지낸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방울의 종류로는 대신방울, 아흔아홉상쇠방울, 칠성방울, 군웅방울 등이 있다.
대신방울은 주로 무당들이 점을 볼 때 흔들면서 사용하는 방울로 열두대신방울이라고도 한다. 주로 한양굿을 하는 무당들이 많이 사용한다. 놋쇠로 된 쇠막대기 끝부분에 4개의 구멍에 방울을 각각 3개씩 달아서 사용한다.
아흔아홉상쇠방울은 황해도 무당들이 주로 사용한다. 이 방울은 99개의 조그만 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 방울을 상쇠방울, 상쇠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쇠라고 하면 풍물패 리더인 꽹과리를 치는 사람을 상쇠라고 하듯이 무당이 사용하는 신기물 중 으뜸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나 생각한다.
아흔아홉상쇠방울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쇠를 같이 매달아 사용한다.
아흔아홉방울은 수(壽)자가 새겨진 명(壽)쇠, 복(福)자가 새겨져 복(福)쇠, 납작하게 만들어진 길쇠, 둥근 모양의 명두(明斗)쇠로 구성돼 있다. 길쇠는 신과 교신하고 신이 강림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명두쇠는 신내림 받을 때 신과의 교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 짝쇠라고 하여 방울이 반으로 쪼개져 한 짝을 이루는 방울로 천지(天地)의 신 즉, 음양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됫박쇠라고 하여 굿을 하는 중간에 방울에 쌀 산을 주기(쌀 점을 보기) 위하여 만든 방울이 있다. 이때 됫박쇠에 붙여서 주는 쌀을 무당에게는 불릴 쌀과 외길 쌀이 되고, 신도들에게는 명쌀, 복쌀이 된다. 쌀을 방울에 묻혀서 주기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만들어졌다.
칠성방울은 일곱 개의 방울이 달려있다. 칠성굿에서 명(命)과 복(福)을 줄 때 사용하는 방울이다. 요즘에는 이 방울을 사용하는 무당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군웅방울은 군웅굿을 할 때 사용하는 방울로 군웅방울을 다른 말로 뚝대방울, 매방울이라고 부른다.
이 방울은 군웅대 끝에 매달아 사용하는 것으로 군웅대는 약 1미터 길이 나무 막대기에 굿을 의뢰한 단골집 속옷을 감는다. 그 위에 흰 광목을 두른 뒤 다시 삼베를 묶고 군웅방울을 매단다. 군웅대의 연유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지만 단군세기의 기록을 인용하면 나무에 옷을 입혀 웅상(雄常)이라 부른 데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곧 웅상이 바로 한웅천왕의 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지녔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뚝대라는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대 한웅천왕인 치우천왕은 도깨비 대왕이라고 했다. 치우천왕이 죽고 난 뒤 그를 기리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를 치우제 또는 둑제라고 불렀다. 임금이 사열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깃발이 둑기로 도깨비가 그려진 깃발이다. 서울의 뚝섬도 예전에 치우천왕 사당이 있어 그곳에서 해마다 둑제를 지냈기 때문에 뚝섬이라 불렀다.
이렇게 보면 뚝대는 바로 한웅천왕의 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치우천왕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몽골의 무당들도 뚝대라고 부르고 있다.
그 외에 본향(本鄕)쇠, 서낭쇠, 무병장수쇠, 건강쇠, 운수쇠, 재수쇠, 벼슬쇠, 천하궁쇠, 지하궁쇠, 용신쇠 등의 방울이 있다. 이것들은 굿거리 중 필요에 따라 이름들을 갖다 붙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방울은 무당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기물이다. 상고시대에 통치자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물로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 문헌이나 고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방울의 모양이 어디서 연유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방울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콩의 모양과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콩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은 콩을 신께 바친 최초의 곡물로 신성시했기 때문이다.
콩을 나타내는 한자 ‘두(豆)’는 제기 위에 음식을 바친 모양이다. 또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우리만 콩으로 해석하는 문자가 바로 ‘태(太)’자다. 콩을 ‘서리태’ ‘백태’ ‘유월태’ 등 태자를 붙였다. 콩을 태(太)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최초의 곡물, 태고(太古)적 하늘에 받친 음식이란 뜻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 민족은 콩의 모양으로 제사장의 상징물인 방울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무당들이 방울을 사용하고 있다.
조성제(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박사)
 서울대·구루미·교원대, 에듀테크 ‘진짜 효과’ 입증한다… AI 기반 실증 연구 착수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소장 조영환)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소장 백성혜), 온택트 AI 플랫폼 기업 구루미(대표 이랑혁)가 손을 잡고 에듀테크가 실제 교실에서 발휘하는 학습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구루미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업해 ‘에듀테크 수업 도구 학습 효과 평가를 위한 교실 데이터 구축 및 평가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협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
서울대·구루미·교원대, 에듀테크 ‘진짜 효과’ 입증한다… AI 기반 실증 연구 착수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소장 조영환)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소장 백성혜), 온택트 AI 플랫폼 기업 구루미(대표 이랑혁)가 손을 잡고 에듀테크가 실제 교실에서 발휘하는 학습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구루미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업해 ‘에듀테크 수업 도구 학습 효과 평가를 위한 교실 데이터 구축 및 평가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협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 개최… 성장과 신뢰의 한 해, 내년 전망도 ‘청신호’
매월 1만9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수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BE FORWARD)가 쉐라톤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태국,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UAE(두바이) 등 총 8개국에 거점을 두고 6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는 비포워드에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두드러진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한국 지사 설립 이후 꾸준히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 개최… 성장과 신뢰의 한 해, 내년 전망도 ‘청신호’
매월 1만9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수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BE FORWARD)가 쉐라톤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태국,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UAE(두바이) 등 총 8개국에 거점을 두고 6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는 비포워드에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두드러진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한국 지사 설립 이후 꾸준히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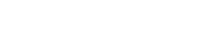
 [이윤정 시인의 書評] 작은 완장의 무게 – 소설 윤흥길의「완장」을 읽고
[이윤정 시인의 書評] 작은 완장의 무게 – 소설 윤흥길의「완장」을 읽고
 새해 예산안 '727.9조' 국무회의 통과
새해 예산안 '727.9조' 국무회의 통과
 조성제의 무속이야기 (38) 삼칠(3,7)일 기도의 시작
조성제의 무속이야기 (38) 삼칠(3,7)일 기도의 시작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