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제(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솟대'는 나무나 돌로 만든 오리를 긴 장대 위에 앉혀 놓은 것을 말한다. 정월 대보름날 마을 굿이나 동제를 모실 적에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입구 등에 세웠다.
조성제(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솟대'는 나무나 돌로 만든 오리를 긴 장대 위에 앉혀 놓은 것을 말한다. 정월 대보름날 마을 굿이나 동제를 모실 적에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입구 등에 세웠다.
솟대의 시작은 한웅천왕이 신시를 열면서 천신을 모시기 위하여 만든 소도에 세우면서부터다. 솟대를 세운 곳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 죄인이 들어와도 잡아가지 않았다. 소도에는 박달나무가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나무를 한웅의 상, 즉 웅상이라 부르며 방울과 북을 매달면서 솟대가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솟대가 무교(무속)와 함께 미신이라 여겨 가치가 폄하되어 보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곳곳에 솟대를 세우고 장식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솟대를 신성시하는 역사는 북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청동기시대의 제기에도 나뭇가지나 기둥에 새를 앉힌 조형물이나 문양이 발견된다.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또 청동기시대까지 올라가는 시간성은 솟대가 고대 마고 삼신시대 신앙 조형물로 전파된 보편적인 삼신신앙의 상징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솟대는 세 가닥의 나뭇가지에 반드시 오리 세 마리가 앉아있다. 예전에는 그 새가 오리가 아니고 기러기라는 설도 있었으나 지금은 오리라는 것이 정설이다.
새에 대한 신앙은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있는 새가 영매자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단군시대의 구가(九加) 중 새의 이름을 딴 학가(鶴加), 응가(鷹加), 노가(鷺加) 가 있다는 것만 봐도 새에 대한 외경심을 알 수가 있다. 새는 벽사의 힘을 지녔다고 믿었고 삼재 부적을 비롯한 여러 부적에도 사용되고 있다.
새가 지니는 상징은 새에 따라 다르다. 기러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동안 지조를 지키는 정절의 새로 여기기에 혼례 때 등장한다. 까치는 헤어진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고 믿고 있으며, 까막까치는 저승길을 인도하는 저승사자를 나타내기도 한다.
꿩은 남을 존경할 줄 아는 새로, 닭은 귀신을 쫓는 새로, 매는 풀지 못한 일을 해결해 주는 새로, 박쥐는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는 새로, 부엉이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려주는 길조로, 비둘기는 금슬 좋은 부부로, 올빼미는 재앙을 예견하는 새로, 제비는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의 사자로, 학은 고고한 인품을 지닌 선비를 상징하기도 한다.
우리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지닌 새가 까마귀다. 효성스러운데다,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가 있다.
그런데 왜 많은 새 중에서 오리를 솟대에 앉혔을까 하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리는 오리과의 작은 물새를 통틀어 말한다. 일부 텃새도 있지만 대개는 북쪽에서 번식해 가을에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는 겨울 철새다.
오리의 잠수능력은 수계(水界)나 지하세계와 관련한 종교적 의미가 있다. 또 하늘, 땅, 물을 그 활동 영역으로 하고 있기에 일반 들새나 산새보다도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기에 충분하다.
특히 오리는 물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경 마을에서는 비를 가져다주는 농경신으로 정착되었다.
전북 정읍군 산외면 목욕리와 진안군 마령면 사곡리,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에서는 오리는 물에서 사는 짐승이라 화재를 방지한다고 하여 솟대를 세웠다고 한다.
오리의 특성은 철새라는 점이다. 철새는 계절이 바뀌는 변화를 암시해 주고 초자연적 세계로의 여행을 의미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넘나드는 영혼의 순환적 여행을 뜻하기도 한다.
그 예로 퉁구스족은 오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영혼의 이주(移住)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새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인간과 신의 중계자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새의 알은 대개 불멸성, 잠재력, 생명의 신비, 생식의 근원 등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파종 때에 주머니에 알을 넣고 있거나, 밭에 알을 파묻는 속신도 생겨났다. 경주지방에서는 각 가정의 방문 앞 처마에 꿩알의 껍질을 줄에 꿰어 달아놓으면 상서로움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새 중에 으뜸으로 여겼기에 오리를 한자로 압(鴨)이라고 부른다.
이 압자를 파자하면 ‘갑甲’자와 새 ‘조鳥’자가 결합됐다. 즉 오리는 새 중에서 가장 으뜸, 첫 번째라는 뜻으로 역법의 주기인 육십갑자 첫머리인 갑(甲)자를 새 앞에도 붙였다. 그 이유는 바로 오리가 신시의 상징인 소도의 솟대에 앉아있는 새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9, 워즈오토 ‘최고 10대 엔진’ 수상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의 동력시스템이 워즈오토가 선정하는 ‘2025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Wards 10 Best Engines & Propulsion Systems)’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차량이 2022년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 2024년 아이오닉 5 N에 이어 2025년 아이오닉 9까지 4년 연속 선정되며,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현대차 아이오닉 9, 워즈오토 ‘최고 10대 엔진’ 수상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의 동력시스템이 워즈오토가 선정하는 ‘2025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Wards 10 Best Engines & Propulsion Systems)’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차량이 2022년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 2024년 아이오닉 5 N에 이어 2025년 아이오닉 9까지 4년 연속 선정되며,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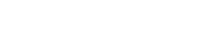
 정일영 의원 “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 청렴도 평가 4등급 추락”
정일영 의원 “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 청렴도 평가 4등급 추락”
 SNS 마켓 상위 1% 연매출 9억 원…소득 격차 뚜렷
SNS 마켓 상위 1% 연매출 9억 원…소득 격차 뚜렷
 김영삼대통령 10주기 4차 세미나...변화와 개혁
김영삼대통령 10주기 4차 세미나...변화와 개혁
 [이경국 칼럼] 색(色)다른 동요 풀이-섬집아기
[이경국 칼럼] 색(色)다른 동요 풀이-섬집아기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