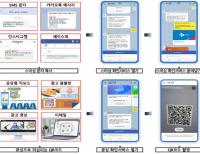조성제(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성제(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황해도 만신들이 굿을 할 때는 반드시 떡시루에 서리화를 꽂는다. '서리화' 명칭은 나뭇가지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서리화는 단순히 굿상을 아름답게 하고 신령님들의 통로인 꽃과 같은 기능만 가진 것일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산해경>을 보면 "흰 털이 난 소를 모우(旄牛)"라고 하며 ‘모우의 꼬리를 모(旄)"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강희자전>에는 "모모우미무자소지이지휘(旄旄牛尾舞者所持以持麾)"라는 기록이 있다. 모는 모우의 꼬리이고 춤을 추는 자는 일정한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휘두른다는 뜻이다.
우리 속담에 ‘소꼬리 쥔 놈이 임자다’ 란 말이 있듯이 모우의 꼬리를 쥔 사람이 천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한인천제와 한웅천왕 그리고 단군왕검 같은 분들이다.
지금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부채 끝에 긴 천을 달아 그것을 쥐고서 춤을 춘다. 이러한 행위도 흰 쇠꼬리를 쥐고서 춤추던 그때의 풍습이 아닌가 한다.
무당이 되기 위해 내림굿을 할 때는 반드시 신대(神坮)가 있어야 한다. 이 신대를 통하여 신들이 하강하는 것이다. 신대는 사철 푸른 나무를 사용하는데, 북쪽은 소나무 남쪽은 대나무가 사용된다. 만주나 연해주 등은 버드나무가 신목이다.
신대(神坮)와 같이 신이 강림하는 통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일월성신(日月星辰)다리’다. 일월성신다리는 해와 달과 별이 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곳으로 명주천으로 만든다.
신대(神坮)의 기원은 ‘마리구’ ‘모리구’에서 나온 것으로 모구(旄彭)가 된다.
마리구의 ‘마(麻)’는 삼신을 뜻하고, ‘리(氂)’는 쇠꼬리를 뜻하고, ‘구(丘)’는 언덕 또는 혈구(구멍)를 뜻하니, ‘마리구’를 풀이하면 “삼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쇠꼬리를 세우는 구멍” 이란 뜻이 된다.
"토지고자왈구 인고이사천 고어지상(土地高者曰丘 因高以事天 高於地上)"이란 기록이 있다. <강희자전>. 땅이 높은 것을 구라고 한다. 높으므로 하늘을 섬기는 일을 한다. 고로 땅 위에 있다. (丘事天)
이 기록은 바로 하늘을 섬기는 장소를 기록한 것으로 바로 천제(天際)를 올리는 장소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하이사지 고어택중(因下以事地 故於澤中)" <강희자전>. 낮게 있음으로 해서 땅에 제사 지낸다. 고로 물 가운데 있다. (丘事地)
이것은 지신(地神)에게 제사를 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전국의 고찰에 가면 절 마당 가장자리에 높다란 철심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당(幢)을 세운 흔적으로 불교에서는 당간지주라고 불렀다.
옛 문헌들을 보면 제사 터가 되는 땅에 당(幢. 아래로 늘어뜨린 긴 깃발)을 꽂았다고 한다.
청구 조선의 중심이 되는 땅을 ‘천부단’이라고 하였고, 그곳을 ‘소도’라고 불렀다. 청구의 소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모(旄)를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 겸, 통치자들이다.
굿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모(旄)를 꽂는 장소를 나타내는 기록이 있다.
"구비인위지왈구 구전고후하모(丘非人爲之曰丘 丘前高後下旄)"<강희자전>. 구는 사람을 위한 언덕이 아닌 것을 구라고 한다. 언덕은 앞이 높고 뒤가 낮은데 모를 꽂는다.
그 당시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혈구에 모(旄)를 꽂았다는 기록이다.
몽골에서는 흑모(黑旄)와 백모(白旄)가 있다. 백모는 평화를, 흑모는 전쟁을 암시하는 모(旄) 기다.
이 ‘모’를 꽂는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다. 바로 굿을 할 때 떡시루에 서리화를 꽂거나, 마을굿을 할 때 봉죽화 또는 서리화를 크게 만들어 세우는 것이다.
굿을 할 때 세우는 서리(설)화는 단순히 꽃이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삼신의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신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모례(毛禮)라고 한다. 그의 이름에서 쇠꼬리를 뜻하는 모(毛)와 예절의 례(禮)는 쇠꼬리를 들고 하늘에 예를 표하는 무당의 이름으로 적합하다.
무당들이 떡시루에 서리화를 꽂으면 바로 나라의 중심인 제사 터에 모(旄) 기를 꽂는다는 의미와 삼신의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떡시루는 나라의 국경을 의미하고, 팥고물은 백성을, 떡을 세 켜로 찌는 것은 바로 삼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떡 한가운데 모(旄)의 상징인 서리화를 꽂으므로 그 굿을 주관하는 무당은 당연히 그 굿판의 제사장이 되며, 그 굿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시대의 한인천제는 풍이(風夷)의 족장(族丈)으로 제사장이었다. 한인천제가 천제를 지낼 때 도와주는 집단이 바로 풍물패였다. 풍물은 바로 한인천제의 족속인 풍이족의 문물이라는 말이다.
그 당시 모우(旄美)를 휘두르는 유습은 오늘날 풍물패들이 쓰는 전립의 상모(上旄)에 그대로 남아있다. 상모란 모자 꼭대기에 달린 쇠꼬리라는 뜻이다. 풍이는 구이(九夷) 중 하나이다.
 예스24, 새학기 맞아 서점사 유일 eBook PC 뷰어 필기 기능 고도화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새학기를 맞아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eBook PC 필기 기능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개강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eBook 학습에 대한 수요가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새학기 학습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예스24는 지난 7월 전면적으로 eBook PC 뷰어 리뉴얼을 실시한 데 이어 8월 말 eBook PC 뷰어 필기 신규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예스24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PC 뷰어에 특화된 신규 기능을 선보였다. PDF eBook 페이지 내 원하는 위치에
예스24, 새학기 맞아 서점사 유일 eBook PC 뷰어 필기 기능 고도화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새학기를 맞아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eBook PC 필기 기능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개강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eBook 학습에 대한 수요가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새학기 학습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예스24는 지난 7월 전면적으로 eBook PC 뷰어 리뉴얼을 실시한 데 이어 8월 말 eBook PC 뷰어 필기 신규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예스24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PC 뷰어에 특화된 신규 기능을 선보였다. PDF eBook 페이지 내 원하는 위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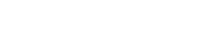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성료, ‘제주 이니셔티브’로 스타트업 협력 새 장 열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성료, ‘제주 이니셔티브’로 스타트업 협력 새 장 열다
 LG U+, 키즈특화 캐릭터 무너 `문구야 놀자`서 만난다
LG U+, 키즈특화 캐릭터 무너 `문구야 놀자`서 만난다
 김윤덕 장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교통 인프라 현장 점검
김윤덕 장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교통 인프라 현장 점검
 ‘김영삼 민주주의 사색길’ 함께 걸어요!
‘김영삼 민주주의 사색길’ 함께 걸어요!
 조성제의 무속이야기 (26)떡에 꽂는 ‘서리화’의 의미
조성제의 무속이야기 (26)떡에 꽂는 ‘서리화’의 의미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