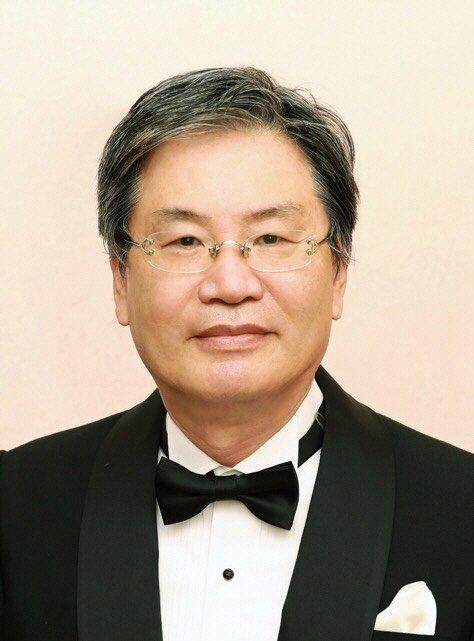
글 / 김희곤
공부 잘하고 얼굴 곱고 반장 자리까지 꿰찬 아이, 은주(가명)는 나와 말 한마디 섞은 적 없는 존재였다. 초등학교 4학년, 열한 살의 나는 그녀를 마치 하늘 위 별처럼 바라보며, 그녀가 교실을 지나칠 때면 괜히 연필을 깎는 척 고개를 숙였다. 이유 없이 부끄러움이 솟구치던 나이였다. 나는 부반장이었고, 그녀는 반장이었다. 내 가슴 깊은 곳엔 짝사랑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던 감정 하나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은주는 뭐든 잘했다. 아버지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였고, 시내 중심가에 병원을 차린 이었다. 집안도 대단했다. 큰오빠는 서울대 법대생, 은주는 막내딸이자 집안의 보배로 통했다. 반면 나는 좁은 골목 안, 조부모님이 살던 한옥에서 지냈다. 그래도 사는 집안이라 외지 식 구들이 끊이질 않았고, 방 하나쯤은 늘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고, 종손으로서의 위엄이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우리 집 보배야. 걸어 다니는 황금알이란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안의 자격지심을 덜어주진 못했다. 나는 반장도 못 되고, 옷차림도 남달랐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에 세일러복을 입고 다닐 때, 나는 아버지의 헌 바지를 할머니가 고무줄 넣어 만든 헐렁한 바지를 입고 다녔다. 머리는 동네 이발소에서 동자승처럼 빡빡 밀었고, 발엔 검정 고무신이 늘 따라붙었다. 활동복 대신, 체육 대회 때 받았던 러닝셔츠 하나가 여름철 유일한 상의였다. 기계 버짐이 머리에 피면 할머니는 된장을 듬뿍 발라 주셨다. 그 냄새는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됐다.
"된장 소년이다! 된장 냄새난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책상 밑으로라도 숨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장면들이지만, 그땐 정말로 비참하고 부끄러웠다. 내 유년기는 어른들의 뜻깊은 계산 아래 보호받으며 길러진 것이었지만, 아이인 내겐 그 모든 것이 고통으로 다가왔다. 비가 오던 어느 날, 하굣길에 나는 우산도 없이 가방을 머리에 올려 걷고 있었다. 그때, 은주가 빨간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같은 방향이니까 우산같이 쓰자." 그녀의 말은 내게 꿈처럼 들렸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빨간 우산으로 들어갔다. 우산 속에 나란히 걷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그러나 흙탕물 튄 내 헐렁한 고무신이 문제였다. 철퍼덕거리는 소리 끝에 은주의 하얀 종아리에 흙이 튀었고, 놀란 그녀의 표정에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 그냥 뛸게!" 나는 우산 밖으로 뛰쳐나와 두 주먹을 쥐고 내달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물으셨다. "우리 황금알, 뭐가 그리 급해서 생쥐 꼴이냐?" 나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썼다.
내 나이 고작 열한 살, 그날의 쪽팔림은 밤잠도 달아나게 했다. 2학기가 되자 나는 눈이 나쁘다는 핑계로 선생님께 앞자리로 옮겨 달라 졸랐다. 사실은 은주 옆에 앉고 싶어서였다. 기적처럼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나는 은주의 짝이 되었다. 은주가 책장 넘기는 소리, 연필 깎는 소리만으로도 내 가슴은 요동쳤다. "은주야, 이 문제 좀 알려줄래?" "여기 풀어보고, 모르면 언제든지 물어봐." 그녀의 말은 내게 천금을 안겨주는 계약서 같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루 만에 끝났다. 은주의 어머니가 곱게 차려입고 교무실에 다녀간 뒤, 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혼자 뒷자리로 옮겨졌다. 온 우주가 무너져 내렸다.
"된장 소년이다! 된장 냄새난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책상 밑으로라도 숨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장면들이지만, 그땐 정말로 비참하고 부끄러웠다. 내 유년기는 어른들의 뜻깊은 계산 아래 보호받으며 길러진 것이었지만, 아이인 내겐 그 모든 것이 고통으로 다가왔다. 비가 오던 어느 날, 하굣길에 나는 우산도 없이 가방을 머리에 올려 걷고 있었다. 그때, 은주가 빨간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같은 방향이니까 우산같이 쓰자." 그녀의 말은 내게 꿈처럼 들렸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빨간 우산으로 들어갔다. 빨강 우산 속에 나란히 걷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그러나 흙탕물 튄 내 헐렁한 고무신이 문제였다. 철퍼덕거리는 소리 끝에 은주의 하얀 종아리에 흙이 튀었고, 놀란 그녀의 표정에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 그냥 뛸게!" 나는 우산 밖으로 뛰쳐나와 두 주먹을 쥐고 내달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물으셨다. "우리 황금알, 뭐가 그리 급해서 생쥐 꼴이냐?" 나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썼다.
내 나이 고작 열한 살, 그날의 쪽팔림은 밤잠도 달아나게 했다. 2학기가 되자 나는 눈이 나쁘다는 핑계로 선생님께 앞자리로 옮겨 달라 졸랐다. 사실은 은주 옆에 앉고 싶어서였다. 기적처럼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나는 은주의 짝이 되었다. 은주가 책장 넘기는 소리, 연필 깎는 소리만으로도 내 가슴은 요동쳤다. "은주야, 이 문제 좀 알려줄래?" "여기 풀어보고, 모르면 언제든지 물어봐." 그녀의 말은 내게 천금을 안겨주는 계약서 같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루 만에 끝났다. 은주의 어머니가 곱게 차려입고 교무실에 다녀간 뒤, 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혼자 뒷자리로 옮겨졌다. 온 우주가 무너져 내렸다.
그 후로 나는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우산의 추억도, 짝이 되는 꿈도, 모두 꿈속에 묻었다. 그러던 어느 체육 시간, 공을 차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은주가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대답도 제대로 못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달렸다. 언제나 그녀 앞에서는 망신을 당하는 것이 나였다. 어쩌면 그것이 내 첫사랑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은주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가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유년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비 내리는 날이 면 그녀는 다시 내 마음에 피어나곤 한다. 이 글이 지금의 소년· 소녀들에게 가닿기를, 그들도 언젠가 나처럼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웃을 수 있기를.
김희곤(시인·소설가·수필가·행정학 박사) : 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전 한국정책학회 전략부회장,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문인협회·한국국보문인협회 회원, 국제계관시인연합(UPLI)한국본부 회원. 저서 수필집 <여정의 끝자락은 소리 없는 바람이었다> 등, 학술서<논어간해(論語簡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