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가 보면 놀라운 일도 많지만 가끔씩 희귀한 일에 마음을 앗기는 경우도 있다.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거미에게 잡혀 먹히지 않고 도망을 치는데 성공한 경우를 보았다.
사실 발버둥이 아니라 날개의 힘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거미는 끈적한 줄을 만들어 놓고는 잘 보이지 않는데 숨어 있다가 먹이가 걸려들면 쏜살같이 나타나서 숨통을 거두게 한다.
거미는 다리가 8개로 곤충이 아니다. 곤충은 6개의 다리가 있다. 곤충이 없는 독성을 거미는 지니고 있다.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서 살아가는 소나무를 보면 경외심(敬畏心)이 일어 난다. 바위가 무생물로 알고 있으나 타원운동을 하니 다른 생명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다.
태풍에 거목은 뿌리를 뽑히게 되지만 바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소나무는 거뜬히 견디어 낸다. 이는 인류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옥토가 아닌 박토(薄土)란 사실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이다.
여리고 연약한 잡초가 시멘트사이를 비집고 움을 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이 스친다. 생명있는 모든 것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지 곱씹어 보게 한다.
새마다 집을 짓는데 이는 새들의 주거(?)목적도 있긴 하지만 알을 낳아서 대(代)를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더러 뱀의 공격으로 알을 잃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까치집은 감동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산행시 까치집을 보면 필자는 한참동안 설명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조류는 발과 입으로 거처할 훌륭한 주택(?)을 거뜬히 지어 내기 때문이다. 까치집은 가로와 새로는 물론이고 둥글게 나무를 얽히게 하여 태풍이 몰아쳐도 견디어 낼 수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소싯적에 산에 땔감을 하러가면 실컷 놀다가 까치집을 뜯어 오는 친구가 있었다. 필자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으니 생명에 대해서 일찍 눈이 뜬 것같다.
감나무에는 까치가 집을 짓지 않는다 했는데 주위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 버리니 감나무에 까치집을 지은 것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다.
특히 감나무는 7덕 이라하여 새가 집을 짓지 않을 뿐더러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집주변에 감나무가 많은 이유이다.
아직 까마귀 둥지는 본 적이 없다.
알을 낳고 살아가니 어딘가 집이 있을텐데......
이경국(칼럼니스트·사단법인 박약회 운영위원)
 ‘온라인삼국지2’ 초심 서버 1주년 기념 역대급 점핑 혜택 쏟아진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대표 이호형)은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온라인삼국지2’의 인기 서버 ‘초심’이 1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4월 첫 선을 보인 ‘초심’ 서버는 오리지널 전장을 비롯해 새롭게 추가된 이계의 낙양, 어둠의 남만 등 참신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유저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아왔다. 특히 전장의 밸런스 조정과 아이템 시세 관리 등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으며 지난 1년간 탄탄한 서비스를 이어왔다. 이번 1주년 대축제에서는 신규 및 복귀 유저를 위한 9
‘온라인삼국지2’ 초심 서버 1주년 기념 역대급 점핑 혜택 쏟아진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대표 이호형)은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온라인삼국지2’의 인기 서버 ‘초심’이 1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4월 첫 선을 보인 ‘초심’ 서버는 오리지널 전장을 비롯해 새롭게 추가된 이계의 낙양, 어둠의 남만 등 참신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유저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아왔다. 특히 전장의 밸런스 조정과 아이템 시세 관리 등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으며 지난 1년간 탄탄한 서비스를 이어왔다. 이번 1주년 대축제에서는 신규 및 복귀 유저를 위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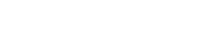
 인천공항공사, 공항경비대 훈련용 실내 사격장 개장
인천공항공사, 공항경비대 훈련용 실내 사격장 개장
 기아, 1분기 매출 28조원 역대 최대…영업이익은 12.2%↓
기아, 1분기 매출 28조원 역대 최대…영업이익은 12.2%↓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120시간 스페셜 시승` 실시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120시간 스페셜 시승` 실시
 ‘1억 송이 꽃의 향연’ ...일산호수공원으로 오세요
‘1억 송이 꽃의 향연’ ...일산호수공원으로 오세요
 [김주호 칼럼] 석가부처님은 단군의 자손, 우리 東夷族이다
[김주호 칼럼] 석가부처님은 단군의 자손, 우리 東夷族이다

 목록
목록










